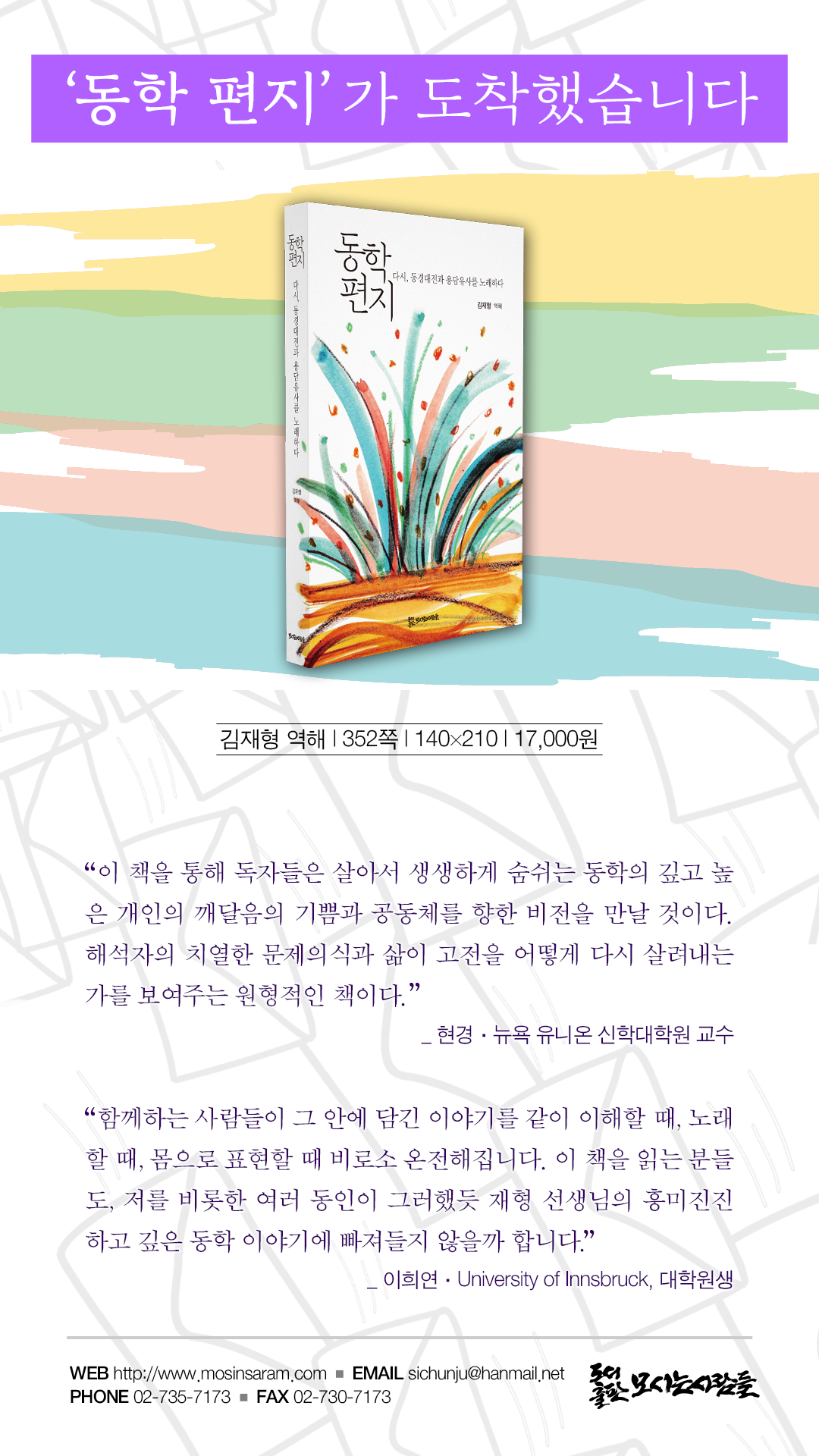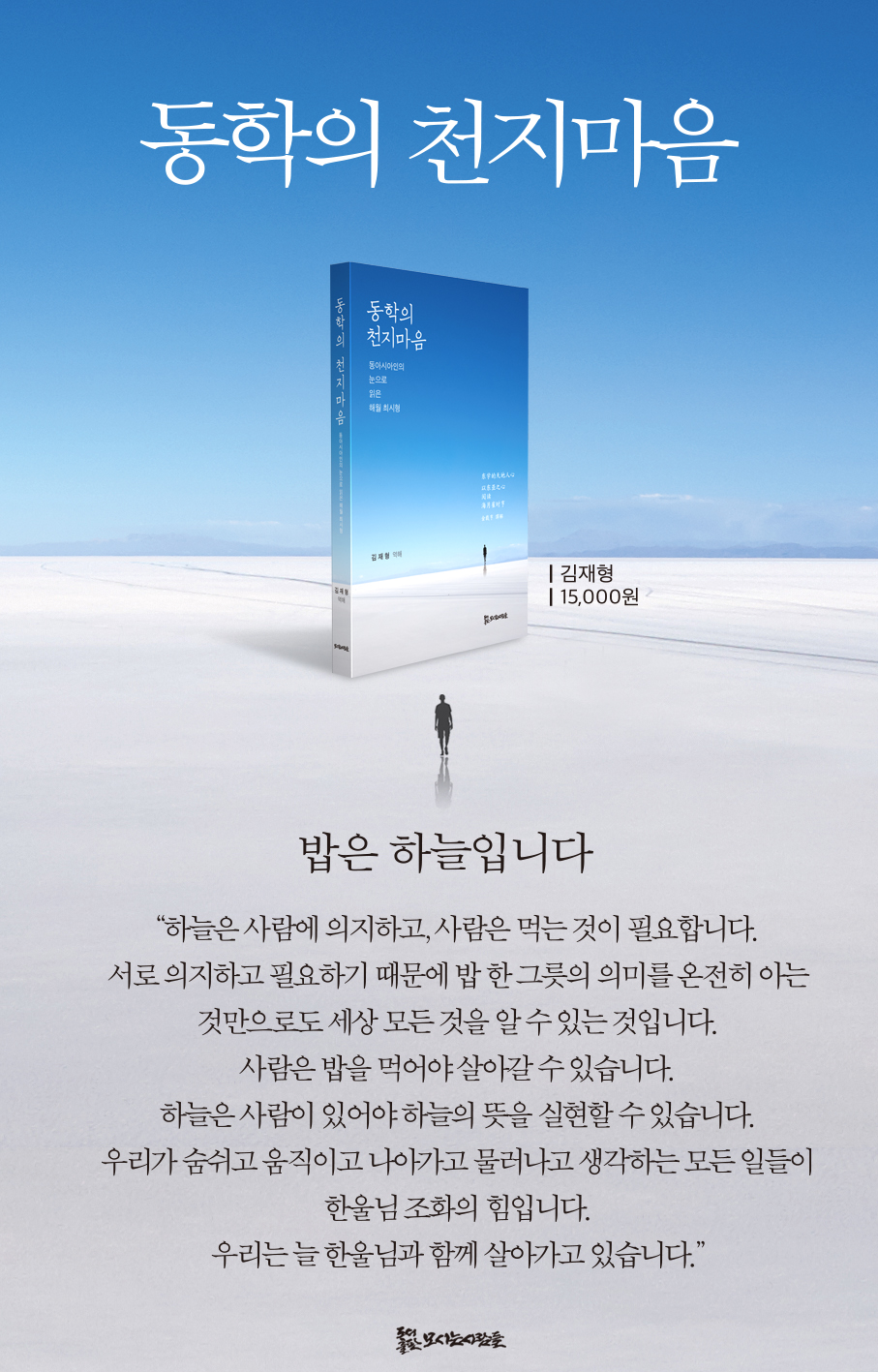요즘 인문학 열풍이 드세다. 여기서 인문학은 학문의 분야를 지칭하기보다 '철학적 성찰'을 의미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에 대한 관심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의 종교학 혹은 신앙 또한 인문학적 성찰이 요긴하다. 신앙은 '이해'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나중에 정성들이는 것이라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일 수 있으나, 종교적 수행은 '성찰'로부터 시작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진리이다.
동학의 수련은 '참회'로부터 시작하며, 그 참회란 다름아닌, 오랫동안 잊어 버리고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도 되새겨볼 대목이다.(<동경대전> '참회문' 참조) 성찰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무엇가를 질문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앎'이 필요하다.
[["뭘 알아야지 질문을 하지!" 학창시절, 수업을 마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씀은 "질문있나?"였다. 우리는 '얼른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이고 보니설령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그걸 꺼내 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선생님은 으레 "돌대가리들! 뭘 알아야지 질문을 하지"라고 농반 진반의 대꾸를 했다.]]
아무튼, 인문학적 종교학 또는 인문학적 신앙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신앙을 하는가?
이 물음은 '왜 사는가?' 또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처럼 영원히 물어야 할 물음이다. 왜 영원한가?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정답이 없다 함은, 반대로 모든 것이 정답이라는 말과도 통한다.
"모든 것이 ~~하다"라는 것은 결국 사물/가치들 사이의 경계를 지우고 경계가 사라지면 인식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경계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러한 경계만들기가 곧 "왜 신앙을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적 답변을 내놓는 과정이다.
이러한 답변은 일차적으로는 추상적 사변이 아닌 실생활 속에서 비롯되는 경험담이어야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험담이란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해 봐서 아는데~~~"의 오류 또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결국은 경험을 초월하는 추상화가 필요하게 된다.
'왜 신앙을 하는가'라는 질문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 그것은 신앙을 하는 종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점검하게 한다. 종교적 도그마에 빠지거나 맹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질문이 사라지고,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는 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인간은 최상의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최상은 또다른 위를 향한 출발점에 불과하다. 다시 한 걸음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정진! 그곳에 신앙의 본질이 있다.
우리의 삶의 본질도 그와 다르지 않다.
'칼럼과 논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통하는사람들(1)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0) | 2014.02.09 |
|---|---|
| 동학농민혁명120주년을 준비하는 출발점 (0) | 2014.01.14 |
| 동학출판과 동학공부 (0) | 2014.01.12 |
| 2014년은 소통의 해 (0) | 2014.01.06 |
| 천도교 남북 교류 협력사 (0) | 2014.01.04 |